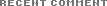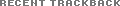제목을 짓다 생각했다. 나는 생산요소조차 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구나 흑흑.
-
턱 괴고 서핑하다 일전에 보았던 시대정신 동영상을 보았다. 처음 보았을땐 꽤나 충격적이었고 결국 내가 내공을 기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 지금에야 다시 보니 허점들도 많다. 역사적 언급들이야 딴지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만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빚을 창출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화폐의 빚은 일괄적인 시간에 갚아질 필요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화폐공급 경로를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이다. 하지만 역시나 극적인 효과를 준 동영상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다. 언젠가 2페이지만을 읽은 뒤 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푸코의 책을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 인용하자면 마치 사회는 감옥과 같다.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이 본래 주체적이기 어렵다. 미디어는 물론 정치에 영향을 받은 교육 및 문화 등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엔 사회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하는 각성을 가지게 되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시스템과 죄수복을 입고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 어떻게 할 도리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경제력이라는 쇠사슬로 묶여버린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소비가 욕망되고 그를 위한 생산이 불가결하며 간간히 얹혀지는 빚이 그의 '어쩔 수 없는 노동' 을 강요한다. 상당히 세련된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이라면 상당히 세련된 전략이기도 하다. 굳이 음모론을 들먹이고 소수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치 않아도 불균등한 구조와 계급적 이해가 걸려 쳇바퀴가 되어 돌아간다.
지금에서야 열폭증세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거 생각대로 산다는 아주 매력적인 문장을 공격했던 내 감정이 바로 이 곳에 기반되어 있다. 그놈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하는 성찰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 만족 및 쾌락과 행복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함께 오버랩된다. 세속적 행복추구가 최선의 삶이라는 식의 문화적 감성 역시 자본주의적 시대정신이나 과거 기독교적 신앙과 다르지 않은 체계적 기만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나의 행복과 감성이 왜 그것이 반응 하는지 인문학적 회의감 없이는 우리 모두 정치 경제적 감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모든 것이 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진부한 사실 때문이다. 회의감을 가지고 진짜 나로부터 시작해 비판적인 자아부터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때 비로소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의미있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와 존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에 의해 강요될 수 없는 생각들은 경제력에 억압받거나 혼자 표류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과자를 열심히 행복하게 섭취하는 기만당하는 노동자들로 가득찬 '생산요소' 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이야기한다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사는대로 생각해버린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생각대로의 삶이 사는대로 사는 삶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함을 남겨본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각성하더라도 왠만하면 그냥 쳇바퀴의 한 요소가 되어버린다. 가장 무서운 것이 그것이다. 가장 세련된 것이 그것이다. 이제 앎과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와 함께 생활과 가정에 '충실' 해야만 하는 도시인들은 알더라도 그저 기존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서핑중 '우리' 라고 지칭한 이들을 타자화하는 구역질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 를 타자화하며 비난하며 비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이고 나이고 너이고 나의 가족, 너의 가족과 나와 너의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어감을 붙일 생각은 없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변화해야할 주체는 잘못이 없는 자들, 그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당황스럽다. 나 역시 '생산요소' 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지 궁금하다. 흔히 거부감 없이 쓰이지만 자신 혹은 친분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며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단어이다. 그리고 꽤나 기분나쁜 단어이다.
-
턱 괴고 서핑하다 일전에 보았던 시대정신 동영상을 보았다. 처음 보았을땐 꽤나 충격적이었고 결국 내가 내공을 기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 지금에야 다시 보니 허점들도 많다. 역사적 언급들이야 딴지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만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빚을 창출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화폐의 빚은 일괄적인 시간에 갚아질 필요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화폐공급 경로를 무시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이다. 하지만 역시나 극적인 효과를 준 동영상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다. 언젠가 2페이지만을 읽은 뒤 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푸코의 책을 교수님의 말씀을 빌려 인용하자면 마치 사회는 감옥과 같다.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것이 본래 주체적이기 어렵다. 미디어는 물론 정치에 영향을 받은 교육 및 문화 등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엔 사회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하는 각성을 가지게 되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시스템과 죄수복을 입고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 어떻게 할 도리가 마땅찮다는 것이다. 경제력이라는 쇠사슬로 묶여버린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소비가 욕망되고 그를 위한 생산이 불가결하며 간간히 얹혀지는 빚이 그의 '어쩔 수 없는 노동' 을 강요한다. 상당히 세련된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이라면 상당히 세련된 전략이기도 하다. 굳이 음모론을 들먹이고 소수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치 않아도 불균등한 구조와 계급적 이해가 걸려 쳇바퀴가 되어 돌아간다.
지금에서야 열폭증세였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과거 생각대로 산다는 아주 매력적인 문장을 공격했던 내 감정이 바로 이 곳에 기반되어 있다. 그놈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하는 성찰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 만족 및 쾌락과 행복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읽고 있는 책과 함께 오버랩된다. 세속적 행복추구가 최선의 삶이라는 식의 문화적 감성 역시 자본주의적 시대정신이나 과거 기독교적 신앙과 다르지 않은 체계적 기만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나의 행복과 감성이 왜 그것이 반응 하는지 인문학적 회의감 없이는 우리 모두 정치 경제적 감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모든 것이 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진부한 사실 때문이다. 회의감을 가지고 진짜 나로부터 시작해 비판적인 자아부터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때 비로소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의미있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물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와 존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에 의해 강요될 수 없는 생각들은 경제력에 억압받거나 혼자 표류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과자를 열심히 행복하게 섭취하는 기만당하는 노동자들로 가득찬 '생산요소' 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이야기한다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사는대로 생각해버린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생각대로의 삶이 사는대로 사는 삶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함을 남겨본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리 각성하더라도 왠만하면 그냥 쳇바퀴의 한 요소가 되어버린다. 가장 무서운 것이 그것이다. 가장 세련된 것이 그것이다. 이제 앎과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와 함께 생활과 가정에 '충실' 해야만 하는 도시인들은 알더라도 그저 기존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수 밖에는 없다.
그리고 서핑중 '우리' 라고 지칭한 이들을 타자화하는 구역질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 를 타자화하며 비난하며 비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우리' 이고 나이고 너이고 나의 가족, 너의 가족과 나와 너의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어감을 붙일 생각은 없다.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변화해야할 주체는 잘못이 없는 자들, 그들이 주체가 되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당황스럽다. 나 역시 '생산요소' 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갈지 궁금하다. 흔히 거부감 없이 쓰이지만 자신 혹은 친분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며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단어이다. 그리고 꽤나 기분나쁜 단어이다.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발전, 불안감. (0) | 2009.05.07 |
|---|---|
| 나비효과? (0) | 2009.05.07 |
| 소비하지 않을 시 불행하도록 만들어라. (0) | 2009.05.07 |
| 원달러 환율하락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0) | 2009.05.01 |
| 일기니까 _ 주댕이 좌파의 변절이 주댕이 뿐이길 (0) | 2009.04.30 |